음모론을 넘어 ‘구조적 시나리오’로 바라본 XRP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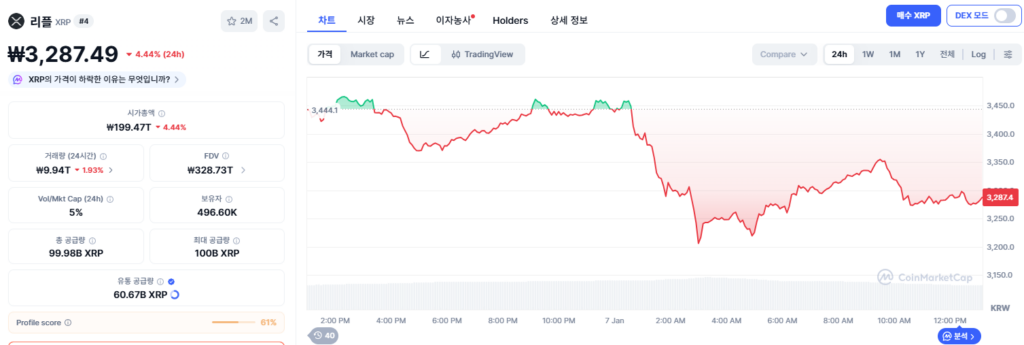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 번 **XRP 엔드게임(XRP Endgame)**이라는 표현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과장된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야기들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구조적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XRP 엔드게임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다.
이 서사는 XRP를 “투자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결제 인프라, 즉 브리지 통화(Bridge Currency)**로 재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만약 XRP가 국가 간 결제, 은행 간 정산, 토큰화 자산 이동의 중간 레이어로 작동한다면, 지금 우리가 익숙한 시가총액 논리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XRP의 고평가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XRP 지지자들의 관점은 다르다. XRP는 보유되어 쌓이는 자산이 아니라, 빠르게 순환하며 가치를 전달하는 유동성 도구라는 것이다. 즉, 동일한 XRP가 하루에도 수백 번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총량이 아니라 신뢰·속도·담보 역할이 된다.
이러한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배경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제도권 편입이다. XRP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ETF·기관 논의가 이어지면서 XRP는 “존재 자체가 논란인 자산”에서 논의 가능한 금융 자산으로 이동했다.
둘째, 글로벌 결제 환경의 변화다. 지정학적 갈등, 통화 블록화, 결제망 분절 현상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빠르고 중립적인 결제 레이어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
XRP 엔드게임에서 자주 언급되는 “레일은 이미 깔렸고, 스위치는 준비됐다”는 표현은 상징적이다. 이는 기술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라기보다, 결제 인프라로 사용될 최소 조건은 갖추었다는 주장에 가깝다. 실제 채택 여부는 정책, 금융기관의 선택, 국제 협력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도 분명하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관성이 크고, 국가 간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XRP가 글로벌 결제의 중심이 된다는 시나리오는 확률이 높은 예측이라기보다, 극단적인 미래 가설에 가깝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단순한 가격 펌핑용 구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XRP 엔드게임은 “XRP가 얼마까지 갈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 “미래 금융에서 가치의 핵심은 보유인가, 이동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XRP를 바라보는 기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보며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서사다.